길샘 김동환의 문화탐색 2-2021년5월호
김문기 후손 김재규와 금녕 김씨 대종회
김영삼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김석수 총리
박정희 시절 국사편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노량진 사육신공원을 뒤로 하고 들어선 유독 높은 빌딩에는 금녕 김씨 대종회라는 금빛글자가 아로새겨져 있다.
금녕 김씨가 어떻게 충절의 아이콘인 사육신묘와 함께 하고 있을까.
사육신은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 하위지, 유성원으로 분명 김씨는 없다.
그런데 사육신공원에는 묘가 6기가 아니라 7기가 있고 그 묘의 주인공으로 참형당한 70인중에 한 분인 김문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지금도 의절사에서는 사육신과 김문기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0월 9일 추모 제향을 올린다.
여기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묘가 6기가 아니라 7기로 조성되었는지 살펴보자.
김문기(金文基)는 조선 세조시절 관직이 공조판서(工曹判書)였으나,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인물로 그가 바로 금녕 김씨의 후손이다.
금녕 김씨의 시조 김시흥(金時興)은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예로 고려 인종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다.
고려 말 김녕(金寧)의 지명이 김해(金海)로 바뀌어 후손들이 김해(金海)를 본관으로 하였으나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 후예들도 본관을 김해(金海)로 써오고 있어 양 김씨(金氏)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로왕의 후손들을 선김(先金)이라 하고, 김녕군(金寧君) 후손들을 후김(後金)이라 하였다. 조선조 말 1884년(고종 21) 예조(禮曹)의 비준(批准)을 받아 시조가 봉군(封君) 받은 김녕(金寧. 김해의 고호)을 본관으로 복관(復貫) 하였다. 1896년(고종 33) 갑오개혁으로 민적령(民籍令)이 시행되면서 본관(本貫)이 복관(復貫)이 된지도 모른 채 일부 후손들이 옛 본적인 김해(金海)를 그대로 등록하거나 분성(盆城)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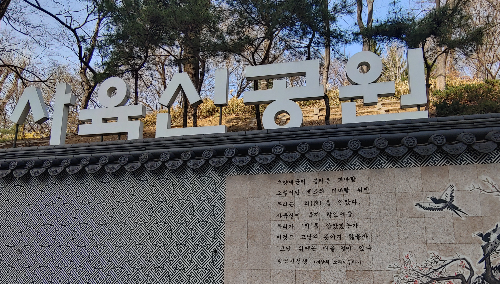
김녕 김씨 충의공파(忠毅公派), 경주 김씨 백촌공파(白村公派), 김해 김씨 백촌공파(白村公派)로 갈라져 있으며, 또 일부는 김해 본관을 유지시켜 김해 김씨 익화파(益和派), 김해 김씨 종남파(從南派), 김해 김씨 법흥파(法興派), 김해 김씨 종민파(宗敏派)로 가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김문기가 단종 절신 사육신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면서 집안이 멸문지화 풍비박산 나버렸다. 이후 조선 헌종에서 고종 때 본관을 김녕(金寧)으로 되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김녕 김씨의 후손으로는 김도현(金道鉉, 김문기의 15대손, 자는 명옥(鳴玉), 호는 벽산(碧山). 조선 말기의 의병장)을 비롯하여 김병조(金秉祚,독립 운동가.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 정부수립 이후에는 김재규(金載圭, 제8대, 중앙정보부장), 김영삼(金泳三, 제14대 대통령), 김종빈(金鍾彬, 제34대 검찰총장), 김석수(金碩洙, 제34대 국무총리), 김준규(金畯圭, 제37대 검찰총장), 김진태(金鎭太, 제40대 검찰총장), 김진태(金鎭台, 검사출신 제19·20대 국회의원(현 정치문화연구소장)등 독립운동가, 대통령, 국무총리, 검찰총장 등 유명 인사들을 배출시키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다.
김재규는 박정희 정권시절 보안사령관, 건설부장관, 유정회 의원, 중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던 핵심 중의 핵심인물이지만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강압통치에 비판적이면서 부마사태에 대한 강력한 무력대응을 저지하다가 결국 박정희대통령을 살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1970년대 후반 갑자기 사육신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보부장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977년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金寧) 김씨(金氏) 문중을 중심으로 유응부(무관) 대신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이다
‘조선사 3대 논쟁’의 저자 이재호 씨는 자신이 쓴 책에서 "김문기의 후손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이며 유신말기인 1977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사육신 중 유응부를 김문기로 바꾸자는 논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이들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2년 6월 6일조의 기사에서 성삼문·이개·유성원·박팽년·하위지·김문기 등 여섯 명에 중점을 두어 거론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의 공적도 현창(顯彰, 밝혀 나타냄)하기 위해 노량진의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도 함께 조성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선근·이병도·신석호·백낙준·유홍렬·조기준·한우근·전해종·김철준·고병익·김도연·이기백·이광린·김원룡이었다.
김문기의 사육신 합류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집현전 학사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과 무과 출신의 무관 유응부가 상왕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김질 등의 밀고로 붙잡혀 능지처사되었다.

'사육신'(死六臣)의 명칭은 생육신의 한분인 추강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六臣傳)』에서 기원하며 『세조실록』에는 없는 용어이다.
김문기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효온이 적시하고 역사적으로 굳혀진 사육신의 일원은 아니다.
김문기의 후손들이 편찬한 『백촌유사(白村遺事)』에도 김문기를 사육신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곧 "국문에 임할 때 선생(김문기)이 나와 육신(六臣)은 모의 역시 같이 했고 의(義) 역시 같은데 어찌 다시 묻느냐" 하고는 "입을 다물고, 혀를 깨물어 답하지 않았다." 라고 전한다. 김문기 스스로가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은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대립각을 보였다.
김재규가 자신의 조상을 현창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장)에게 먼저 제안한 것인지, 특정세력들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유응부를 빼고 사6신의 자리에 김문기를 넣기로 하였지만, 결국 서울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만 김문기까지 모셔져 현재의 '사7신'의 묘역이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이 같은 처사가 알려지면서 이재호·이가원·김성균·이재범·정복구 교수 등이 반론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김재규 사후인 1982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현종)는 심의를 통해 "종래의 사육신 구성을 변경한 바 없다"고 전재하며 김문기의 공적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사 육신과 김문기의 무덤(가묘)과 위패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최초의 6인이 맞는다고 재확인하여 공식적으로는 사육신에 김문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논쟁에 휘말린 노량진의 사육신(사칠신)묘를 지키고 있는 것은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金寧) 김씨(金氏) 문중이라는 점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환경경영학박사,시인,문화평론가)